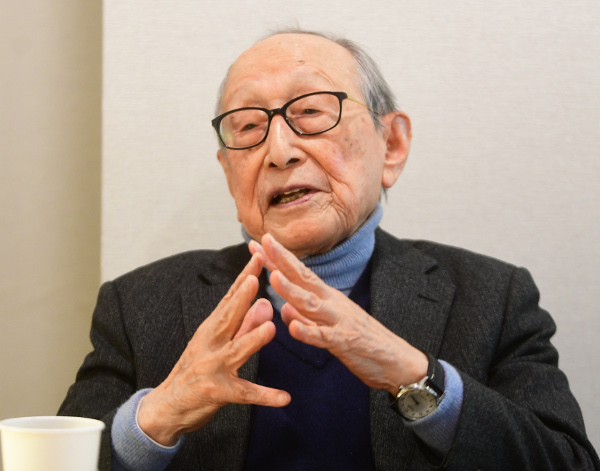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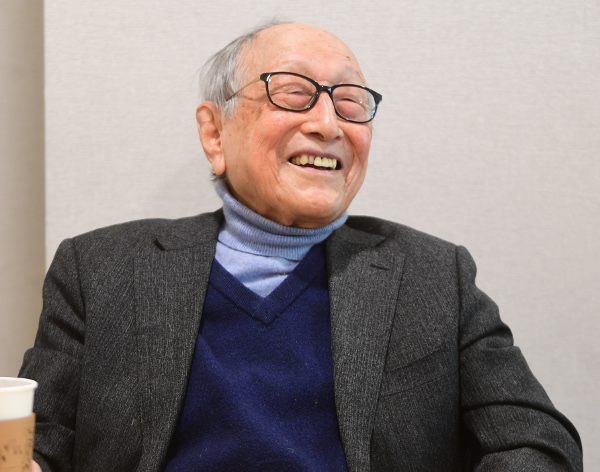
백년 믿음은 단단했다. 독서를 통한 신앙, 교회주의를 넘어선 기독교,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했다. 지혜를 사랑하는 직업의 백세 철학자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인식과 영혼이 뚜렷한 5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하겠다고 답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를 되뇌겠다고 했다.
올해 한국 나이로 103세, 1920년 3월 5일생인 김형석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를 지난달 31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교회에서 만났다. 김 교수는 최근 두란노서원을 통해 ‘김형석 교수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출간했다. 1981년 펴낸 ‘당신은 무엇을 믿는가’의 개정판으로 그의 앞선 저작 ‘예수’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등과 함께한 기독교 신앙 입문 3부작 가운데 하나다. 김 교수는 1951년부터 2019년까지 무려 68년간 교회 밖에서 바이블 클래스를 이끌어왔다. 책과 강의를 통해 믿음이 없던 수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왔다.
-40년 된 내용인데, 지금의 교회와 사회를 말하는 듯합니다.
“지식은 새롭게 바뀌지만 신앙은 내용이 변하진 않습니다. 다만 조금씩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제 책을 이렇게 말하면 이상한데, 1970년대 말에는 제가 조금 앞에 있었고, 당시의 교회는 개인을 앞세우다 보니 조금 뒤에 있었습니다. 통일교 신앙촌 계룡산 등지로 해서 기독교에서 탈선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걸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이블 클래스를 지속하면서 강의했던 내용이 기반입니다. 철학책은 사색해서 끌어내어 쓰지만, 신앙 이야기는 평소 담고 있던 생각을 쓰다 보니 조금 더 편하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책을 통한 지식인들의 회심이 이어졌습니다.
“정치학을 전공한 노광해 미국 텍사스A&M대 교수가 생각납니다. 저의 중앙고 교사 시절 제자입니다. 일찍부터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느라 한국처럼 제자도 없고 친구도 없어 쓸쓸했다고 합니다. 미국 학생들은 학점만 따면 끝이고, 교수들도 친했다가 은퇴하면 남남이니까요. 노 교수는 한국의 사제관계가 너무 부러워 한때 안식년 휴가를 내고 입국해 영남대에서 가르쳐보며 한국행을 진지하게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노 교수가 휴스턴의 한글 책방에서 제 책을 구해 읽고 마음이 바뀌었다고 미국에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미국 학생들을 한국식으로, 한국 제자들처럼 사랑해주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의 부인도 미국서 대학을 나와 월급 타고 일하고 경쟁하고 살았는데, 책을 읽고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디를 가든 형제애를 보이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다고 알려왔습니다. 제가 참 기뻤습니다. 제 책엔 사제관계를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전한 것뿐인데, 열매와 변화는 그렇게 다가옵니다. 신앙의 말씀이 전해지기만 하면 인격과 인생관이 바뀌게 되는 걸 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란 말이 나왔습니다. 신앙의 신비 속에 있는 일입니다.”
-책엔 1951년 장로교 총회가 분열하던 모습도 나옵니다.
“내 신앙을 가만히 보면, 어릴 때는 교회를 통해 신앙을 받아들였고, 신사참배 반대 등을 보며 국가와 민족에 대한 사명감으로 신앙이 성장하는 단계를 거쳤습니다. 그런 다음에 인격과 인생관, 가치관이 변화되며 신앙 수준도 올라갔고,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 주님께서 제게 주신 신앙을 조금은 밖에 내놓고 전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6·25 전쟁 당시 부산에 피난을 갔을 때 부산 중앙교회에서 장로교 총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국제시장서 걸어 올라와 무슨 일 때문인지 중앙교회 앞을 지나다가 한 장로님을 통해 우연히 총회 방청권을 얻어 예배당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전국의 총대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다른 때도 아니고 전란 중인데 하며 혀를 차게 됐습니다. 너무도 실망하고 교회가 꼭 나를 내쫓은 듯한 느낌으로 총회장 밖을 나왔는데, 부산 미국문화원 인근을 지날 때 어디선가 음성이 들립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제가 잘 몰랐던 누가복음 말씀이라 또렷이 기억합니다. ‘그래 교회 나가지 않는 학생들, 젊은이들을 위해서 성경공부라도 하자’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51년부터 피난지에서 시작한 바이블 클래스가 2019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무교회주의자라는 오해도 받으셨습니다.
“무교회주의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신앙은 공동체고 공동체는 교회니까요. 단, 교회 성장만 강조하는 교회주의에 빠져 예수님과 멀어지니까 문제입니다. 제가 1930년대 듣던 도산 안창호 선생, 고당 조만식 장로의 설교에는 목사님들과 다른 무엇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의 설교가 교회에 국한됐다면 이분들은 교회를 넘어 사회, 민족과 국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을 담아내는 더 큰 그릇이 필요한 겁니다. 바이블 클래스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 누구 한 사람 저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가 사회보다 수준이 높아야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반대라면 곤란합니다. 연세대 이화여대 숭실대 서울여대 등지에서 목사가 아닌데 설교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아마 저일 겁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죽음은 극복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신앙의 영역입니다. 마라톤 경기를 뛰는 사람은 완주를 위해 열심히 끝까지 가는 겁니다. 삶의 마지막으로 죽음을 그저 인정하는 겁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죽음이 목적이어서 산 사람은 예수님뿐입니다. 그런 신앙에 이르긴 힘들지만, 죽음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맞이하고 싶다는 소망은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엔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인생을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입니다. 크리스천은 내 인생의 죽음보다 더 큰 뜻,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은총을 위해 살았다는 생각, 더 높은 차원의 긍정이 필요합니다.”
-국민일보 독자들께 새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크리스천이 좀 옹졸합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교회에 설교하러 갈 때는 기도하고 가고, 일반 기업체에 강연하러 갈 때는 그냥 갔습니다. 백살 넘어도 철이 안 들고 어리석다는 이야기입니다. 하하.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강연을 가는 게 더 소중한데 그걸 몰랐습니다. 교회 밖이 전부 악만 가득하고 지옥만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자유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그 자유의 그릇에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본입니다. 새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크리스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div style="border:solid 1px #e1e1e1; margin-bottom:20px; background-color:#f5f5f5;" "="">
김형석 교수의 예수를 믿는다는 것
“사회가 교회를 위해 있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교회가 사회를 위해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불교가 고려를 불행하게 만들고, 유교가 조선을 퇴락시켰듯이 기독교도 역사의 의미를 상실하게 만든다. 종교개혁 당시 가톨릭이 바로 그런 과오를 범했던 것이다. 중요한 것은 교회 자체보다 사회의 그리스도화이며, 교리보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세상을 밝히는 일이다.”(30~31쪽)
“교만한 이성의 소유자들은 유신론자가 되지 않는 반면, 겸손한 이성의 소유자들은 대개 유신론을 택한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마치 물결이 이는 호수에는 달이나 별의 그림자가 드리울 수 없어도 고요한 산중의 호수에는 달과 별의 아름다움이 깃들 수 있는 것과 같다. 겸손하고 성실한 철학자의 심중은 고요한 호수와 같아서 보통 종교적 신앙을 갖고 있었다.”(42쪽)
“기독교적 기업 철학이나 경제 윤리는 간단하다.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노력해서 경제적 부를 쌓으라. 그리고 그것을 너와 네 가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난한 이웃과 사회를 위해 써라’이다. 그렇게 일하는 개인과 기업이 될 때, 우리는 가난하고 게으른 사람이 없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게 된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일에 대한 보수보다 의무를 강조하셨다.”(108쪽)
“사회가 교회를 위해 있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교회가 사회를 위해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불교가 고려를 불행하게 만들고, 유교가 조선을 퇴락시켰듯이 기독교도 역사의 의미를 상실하게 만든다. 종교개혁 당시 가톨릭이 바로 그런 과오를 범했던 것이다. 중요한 것은 교회 자체보다 사회의 그리스도화이며, 교리보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세상을 밝히는 일이다.”(30~31쪽)
“교만한 이성의 소유자들은 유신론자가 되지 않는 반면, 겸손한 이성의 소유자들은 대개 유신론을 택한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마치 물결이 이는 호수에는 달이나 별의 그림자가 드리울 수 없어도 고요한 산중의 호수에는 달과 별의 아름다움이 깃들 수 있는 것과 같다. 겸손하고 성실한 철학자의 심중은 고요한 호수와 같아서 보통 종교적 신앙을 갖고 있었다.”(42쪽)
“기독교적 기업 철학이나 경제 윤리는 간단하다.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노력해서 경제적 부를 쌓으라. 그리고 그것을 너와 네 가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난한 이웃과 사회를 위해 써라’이다. 그렇게 일하는 개인과 기업이 될 때, 우리는 가난하고 게으른 사람이 없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게 된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일에 대한 보수보다 의무를 강조하셨다.”(108쪽)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