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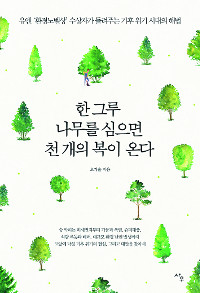
미세먼지, 황사, 지구온난화, 환경난민 등 환경 재앙을 고발하는 책은 많다. 이 책 역시 그런 종류의 하나로 비친다. ‘한반도는 기후변화의 안전지대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도 한다.
하지만 이 책이 읽혀져야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다. 좌절을 딛고 구체적인 성공 모델을 만들어낸 국제환경운동가의 드라마틱한 기록이기 때문이다.
저자가 설립한 시민단체 ‘푸른아시아’는 2014년 환경 분야 노벨상으로 불리는 유엔의 ‘생명의 토지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당시 유엔은 기후변화가 극심하게 나타난 몽골에 나무를 심어 생태계를 복원한 것은 물론 마을 커뮤니티를 살려낸 것을 치하했다. 어떤 지원방식이 실의에 빠진 환경 난민을 살리고, 국가간 의미 있는 환경 공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책이다.
그래서 이 책은 ‘4장-마을이 지구를 살린다’부터 읽어야 제 맛이 난다. 저자 오기출(56)씨는 대학 졸업 후 민주화운동에 헌신하다 기후변화문제의 중요성을 깨닫고 2004년 푸른아시아를 설립했다. 몽골을 찾은 그는 수도 울란바토르 동부 바가노르에서 활동가들과 함께 나무심기 운동을 했다. 3년 노력은 물거품이 됐다. 유목민인 몽골인에게 나무는 가축이 숨으면 찾아내기 힘든 장애물이라는 것을 몰랐으니 실패할 수밖에. 실패에서 교훈을 얻은 그는 주민에게 나무 심기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마을 공동체를 살리는 방법에 매진했다. 마침내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마을이 됐고 그 과정은 왜 환경운동이 커뮤니티 운동이어야 하는지를 웅변한다.
“전쟁 난민은 전쟁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렇지만 환경 난민은 환경 악화로 삶의 기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돌아갈 집이 없다.”
현장 활동가가 쓴 글이기에 우리가 간과하거나 몰랐던 진실들도 엿볼 수 있다. 예컨대 재난마케팅의 함정이 그것이다. 환경 난민들에게 재봉기술을 가르쳐 재활을 돕기도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살 만한가 보네’하며 지원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재활 프로그램이 무시되는 현실이 그런 예다. 또 외국산으로 채워진 구호물품 때문에 재난 현장의 지역경제가 붕괴되기도 한다. 긴급한 구호물품을 제외하면 현지에서 물품을 조달해야 한다는 주장 등 새겨야할 대목이 많다. 푸른아시아는 현재 한국 몽골 미얀마에서 70명의 상근 활동가와 150가구 주민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손영옥 선임기자 yosohn@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