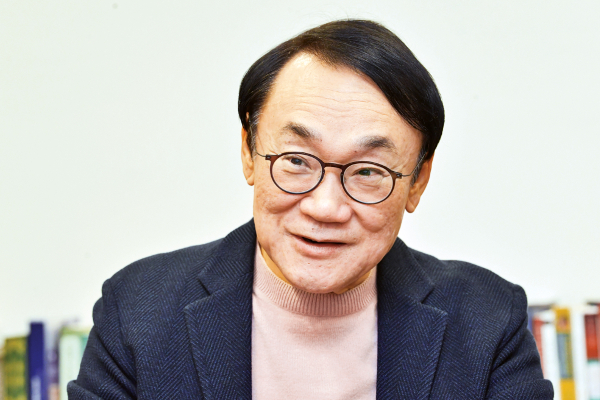


김남준(68) 안양 열린교회 목사가 ‘행복’을 주제로 한 신작 ‘깊이 읽는 여덟 가지 복’(생명의말씀사)을 들고 돌아왔다.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예수가 산상수훈 중 전한 ‘팔복’(八福)이다. 팔복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 ‘온유’하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긍휼한 마음’과 ‘청결한 마음’으로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박해’ 받는 자다. 경제적 안정과 마음의 평안을 행복의 필수요소로 꼽는 현대인의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 대표작 ‘게으름’ 등 80여종의 경건·신학서적을 집필해 220만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린 베스트셀러 저자인 그는 왜 행복에 주목했을까. 지난 20일 경기도 안양의 교회 교육관에서 김 목사를 만나 그 이유를 들었다.
-행복을 주제로 책을 집필하며 팔복을 풀어낸 이유가 있을까.
“모든 이의 관심사인 ‘행복’을 다루기 위함이다. 역사상 행복만큼 오래 지속된 주제도 없다. 문학에서 사랑이 마르지 않는 소재였던 것처럼 철학에서는 행복이 그렇다. 근대를 지나면서 신에 대한 회의 때문에 행복론은 신학적인 토대를 잃는다. 현대에 와서는 개인 행복의 토대가 되는 도덕 원리 자체를 부인하는 사조도 생긴다.
행복이라는 것이 원래 진리처럼 객관과 주관에 걸쳐 있는 것인데, 행복의 근거가 될 객관적, 절대적 기준이 거부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물질적 풍요와 개인의 평안이 행복의 거의 유일한 조건이 됐다. 문제는 이런 사상으로 사는 현대인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고 거기에 어떻게 도달하는지 밝혀보고자 책을 썼다.”
그는 “기독교 행복론의 역사는 세속적 행복론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다. 이 때문에 책에는 성경의 팔복뿐 아니라 고대 그리스 철학자부터 기독교 교부, 근대 계몽주의자의 행복관 등 역사적으로 켜켜이 쌓인 행복론이 밀도 있게 압축돼 있다. 그럼에도 책이 어렵지 않게 읽히는 건 “팔복에 관한 다양한 해석 논쟁은 최소화하고 공감은 최대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독자층을 “신앙 안에서 참된 행복을 찾는 신자로부터 기독교에서 말하는 행복론을 알고 싶어하는 불신자”로 폭넓게 설정한 이유다.
-현대인이 ‘행복하지 않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대인이 행복에 많은 관심을 갖지만 행복에 대한 견해가 매우 일관성이 없고 파편적이며 자기중심적이다. 오늘날 문제는 인생에 대한 고뇌와 진리에 대한 탐구 없이 행복을 쉽게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교회에 오래 다닌 신자조차 이런 세속적인 흐름에 휩쓸린 채 살아가는 게 문제다.”
-교부 오리게네스는 ‘팔복은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는 것이 행복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3세기 교부 오리게네스는 기독교 역사상 탁월한 천재 중 한 사람이다. 그가 한 팔복 해설이 흥미롭다. ‘예수님의 팔복 선언은 자기 인격에 대한 계시’라는 것이다.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이 의도한 참사람이 되는 데 있다. 행복은 그 과정에서 얻는 기쁨과 만족이다. 그 모본을 예수께서 자신의 인격과 삶으로 보여준 것이다. 그분을 닮는 과정이 곧 참된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꽃길만 걷는 팔복의 사람은 없다”며 책을 맺는다. 행복을 논하면서 박해로 이야기를 끝낸 이유가 궁금하다.
“기독교 행복론을 말할 때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이 있다. 천국에서 누릴 행복과 세상에서의 행복 간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다. 천국에선 어떤 악도 없는 ‘지복직관(至福直觀) 행복’(visio beatifica)을 누린다. 세상에선 이런 완전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완전한 사람으로서 완전한 삶을 살았다. 세상에서 인간으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누렸지만 그분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다.
어둠이 미워하지 않는 건 빛이 아니고, 맛없는 것에 환영받는 건 소금이 아니다. 팔복의 사람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게 된다. 어떤 사람에게 그의 존재는 별처럼 빛나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운 물건이 된다. 밉게 보는 이들 때문에 고통을 겪지만 그는 하나님 때문에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세상을 산다. 이 책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건 바로 그 행복이다.”
-띄어쓰기 없이 15자를 1행으로 쓴 에필로그가 인상 깊다.
“한국 초기 문학사에 등장하는 이인직의 ‘혈의 누’도 별로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것대로 글을 읽는 묘미가 있다. 읽다 보면 현대 띄어쓰기보다 훨씬 마음에 와닿는다. 에필로그는 팔당호를 바라보던 풍경을 회상하며 10분 만에 쓴 시다. 필름처럼 지나가는 풍경에 자막을 입히듯 1행 15자로 썼다. 써 놓고 보니 들쭉날쭉하지 않고 두부 잘라 놓은 것 같은 본문이 나왔다. 디자인이 참 색달라 기분이 좋았다. 내용도 책의 핵심에 맞춰 희망을 노래했다. 시는 ‘마른 미역’과 같다고 본다. 글은 한 움큼 정도로 적은데 독자가 자기 생각의 물에 이를 담그면 온 식구가 먹을 수 있는 한 솥 분량이 나온다. 예수님의 팔복도 시 아닌가.”
김 목사는 1행에 15자를 맞춰 쓴 비결로 ‘2세대(2G) 폴더폰’을 들었다. 그는 “언제 어디서든 영감이 떠오르면 폴더폰을 열고 글을 적는다. 그동안 이렇게 책 10권을 썼다”며 “독자의 반응이 궁금하다”고 했다.
-차기작이 궁금하다.
“10대와 20대를 대상으로 한 ‘나는 슬퍼하지 않기로 했다’는 책을 준비 중이다. ‘소확행’ ‘욜로’ ‘꽃길’ 등 최근 청년 세대를 강타한 주제를 거스르는 내용이다. 아픈 청춘에게 일방적 위로를 건네지 않는다. 대신 현실에 눈뜨게 하며 참된 행복을 논한다. 40·50대의 아픔을 논한 ‘마흔 통’과 ‘쉰 통’도 각각 출간 준비 중이다.”
그는 6개월에 걸쳐 이번 책을 완성했다. “초고를 완성하고 18번 교정을 보는 등 평소보다 공을 많이 들였다”고 했다. 한 호흡에 읽을 수 있도록 단어 선별뿐 아니라 운율을 고려해 글을 썼다. 한 손에 책을 쥐기 쉽도록 ‘그립감’도 염두에 두고 제작했다. 누구나 읽기 좋은 책을 위해 심혈을 기울인 흔적이 곳곳에 엿보인다. 김 목사는 다음 달 26일 교회에서 북 콘서트를 열고 직접 독자를 만난다.
안양=양민경 기자 grieg@kmib.co.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