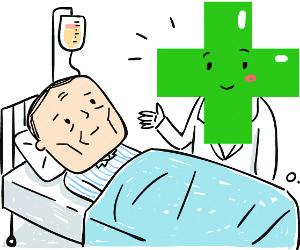

몸이 아플 때는 병원을 찾는 것이 옳다. 그런데 되레 병원을 피하고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나 자가 치료에 몸을 맡기는 환자들이 있다.
몇 년 전 일이다. 50대 남자 환자분이 부인과 함께 필자를 찾아왔다. 대장암이 간까지 번져 수술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은 상태였다. 시기가 문제일 뿐 사실상 사망진단이나 다름없었다.
환자는 힘든 항암 치료대신 각종 민간 대체의학 요법을 찾아 헤매는 길을 선택했다. 결과는 보나마나 실패였다. 자가 임의치료를 시작한 지 1년도 안 돼 그는 필자를 찾아왔다. 몸은 이미 완전히 망가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검사 결과 그는 암성 출혈이 지속돼 혈액양이 건강한 성인남성 기준대비 3분1 수준에도 안 될 정도로 심한 빈혈 증상을 보였다. 일상생활이라도 수행할 수 있게 해보자고 환자를 설득했다. 즉각 수혈과 동시에 항암치료를 시작했다.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된 상태에서 늦게 발견한 사람들은 완치가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곧 시한부 사망선고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항암치료를 포기하고 지내다 통증이 심해지면 진통제나 놔달라는 이도 적지 않다. 모두 잘못된 만남, 그릇된 선택이다.
완치 불가라는 의사의 소견을 사망선고와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다. 진행 및 말기 암 역시 평생 혈당 조절에 신경을 써야 하는 당뇨환자와 같이 비슷한 전략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다. 소홀히 관리하면 금방 합병증이 발생해 생명을 위협하고 삶의 질도 떨어트리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항암제는 독해서 암보다 사람을 먼저 죽일지 모른다고 우려한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최선의 약제를 적절히 투여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종양내과 의사와 긴밀히 협의, 상담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 들어 항암제 부작용을 조절하는 방법이 많이 발전했고, 탈모 유발 항암제도 소수에 그친다. 적어도 부작용이 겁난다고 항암치료를 포기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적극적인 항암치료 대신 증상 조절만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존적 치료를 ‘베스트 서포티브 케어’(최선의 지지치료)라고 한다. 항암 치료가 되레 독이 될 수 있다거나 내성이 생겼을 때 이러한 지지치료가 큰 힘이 된다.
예컨대 늑막에 물이 차서 숨쉬기가 힘들 때는 흉수를 빼주고, 암이 뼈로 옮겨 붙어 신경을 누를 때는 신경차단 시술을 통해 통증을 조절해준다. 암성 출혈로 빈혈이 심할 때는 수혈을, 복수가 차면 복수를 빼주는 처치로 삶의 질 저하를 막아준다.
글=김선혜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혈액종양내과 과장, 삽화=공희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