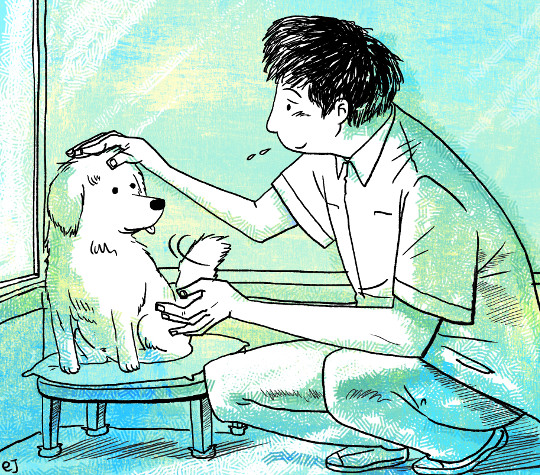

<글 싣는 순서> ① 버려지는 강아지 ② 이래서 버렸다 ③ 입양, 준비는 됐나요 ④·끝 이런 정책을 바란다
사실 이 지면은 ‘유기견 입양기’로 채우려 했다. 입양을 결심하고 유기견 보호소에 두 번이나 찾아갔는데 결국 데려오지 못했다. 왠지 두려웠다.
입양을 결심한 것은 지난달 제주도에 갔을 때였다. 한적한 카페에 앉아 내게 행복을 주는 것들을 적어봤다. 그 리스트에 강아지가 있었다. 반려견을 키울 거라면 유기견을 데려오겠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다. 누군가 나서지 않으면 안락사에 처해질 운명에 대한 동정심이 발동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새 식구를 맞으려면 준비가 필요했다. 가장 시급한 건 싱글남인 내가 출근했을 때 강아지 혼자 집에 남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었다. 사무실에 반려견을 데려와도 되겠느냐고 회사에 물었다. 편집국장은 생각보다 흔쾌히 그러라고 했다. 막상 데려오면 생길지 모를 문제가 몇 가지 떠올랐지만 일부러 모른 척했다.
지난달 11일 경기도 포천에 있는 유기견 보호소에 갔다. 인기척이 느껴지자 녀석들은 득음한 듯한 목청으로 캉캉 짖어댔다. 잭은 오른쪽 눈이 없었고, 반반이는 간질 때문에 가끔 발작을 일으킨다고 했다. 바둑이는 보신탕집으로 팔려가기 직전에 구출됐다. 다들 세상에서 가장 가깝게 지냈던 사람에게 버려져 이곳에 왔다. 작고 따뜻한 생명체들은 대부분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여기서 생을 마감한다.
입양 준비가 끝난 강아지는 차로 20분 정도 떨어진 유기견 카페에 옮겨진다. 그곳에 갔더니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강아지들이 제발 나 좀 데려가라고 호소하듯 달려들었다. 미루와 눈이 마주쳤다.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손을 내밀자 아주 느린 걸음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미루의 눈은 포도 알처럼 크고 까맸다. 세상을 모르는 아이의 눈이라면 저렇게 까말 수도 있겠다 싶었다.
나는 미루를 데려오지 못했다. 잘 보살필 수 있을까, 병원비는 감당할 수 있을까, 사무실에서 막 짖으면 어떡하지, 부서를 옮기면 함께 출근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런저런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집에 돌아와 보름을 더 고민했다. 누군가 이런 조언을 해줬다. “유기견은 새 주인을 못 찾으면 어차피 살처분되는데 그럴 바에야 서툴더라도 데려오는 게 낫지 않겠니.” 그럴 듯하면서도 이 역시 이기적인 생각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지워지지 않았다. 그러다 펼쳐 든 책에서 한 구절이 눈에 띄었다. “어떤 경우든 개를 키우는 것이 개를 키우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다.”(동물학자 콘라트 로렌츠의 저서 ‘인간, 개를 만나다’ 중에서)
지난달 25일 포천 유기견 카페에 다시 갔다. 이번엔 파비앙이란 녀석과 눈이 마주쳤다. 내게 달려들더니 ‘이래도 날 안 데려갈 테냐’ 시위하듯 방방 뛰어오르며 개방정을 떨었다. 이번에도 못 데려왔고, 이유는 비슷했다. 파비앙의 남은 생을 내가 잘 책임질 수 있을까.
두 번의 유기견 시설 방문을 통해 느낀 점은 인간이 개를 사랑하는 것보다 개가 인간을 더 사랑한다는 거였다. 이건 명백했다. 그래서 이번 유기견 기획 시리즈의 타이틀도 ‘강아지가 사람을 사랑하듯’이 됐다.
생텍쥐페리의 소설 ‘어린왕자’에서 여우는 어린왕자에게 말했다. “사람들은 자주 이 진실을 잊어버려. 그런데 넌 잊으면 안 돼. 넌 네가 길들인 것에 평생 책임이 있어. 넌 네 장미에 책임이 있는 거야.” 유기견 입양은 활성화돼야 하고, 그것은 책임이 수반되는 입양이어야 한다. 날 사랑해 줄 게 분명한 강아지를 내가 책임질 준비가 됐을 때, 그때는 정말 ‘유기견 입양기’를 쓸 것이다.
글=이용상 온라인뉴스부 기자 sotong203@kmib.co.kr, 삽화=이은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