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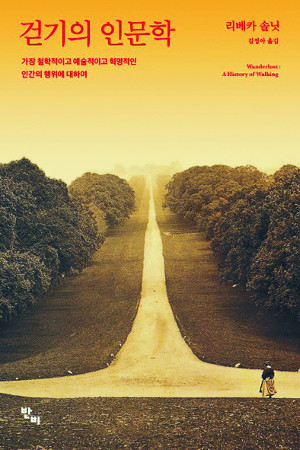
이 책에 담긴 근사한 문장들만 추려도 그럴싸한 서평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대목도 허투루 넘길 수 없는 대단한 에세이다. 인상적인 문구에 밑줄을 긋는 독자라면 난감할 것이다. 책을 읽는 내내 줄을 긋고 또 긋느라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할 테니까. 느리게 읽히지만 오래 기억될 만한 책을 만날 때가 있는데 ‘걷기의 인문학’이 그런 경우다.
저자는 미국의 인문학자인 리베카 솔닛(56). 지난해 국내에 출간된 그의 또 다른 에세이 ‘멀고도 가까운’에는 이런 문장이 담겨 있다. “우리가 책이라고 부르는 물건은 진짜 책이 아니라, 그 책이 지닌 가능성, 음악의 악보나 씨앗 같은 것이다. 책은 읽힐 때에만 온전히 존재하며, 책이 진짜 있어야 할 곳은 독자들의 머릿속, 관현악이 울리고 씨앗이 발아하는 그곳이다.” 그렇다면 저자가 ‘걷기의 인문학’을 통해 파종하려는 씨앗은 무엇일까.
‘걷기의 인문학’이라는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 이 책은 보행에 관한 에세이다. 걷기와 사유(思惟)의 관계를 짚으면서 산책을 통해 영감을 얻은 철학자나 예술가의 삶을 전한다. 걷는다는 단순한 행위를 인문학적 탐구의 대상으로 상정해 글을 풀어낸다는 건 엔간한 학자라면 엄두도 못 낼 작업일 듯한데, 저자는 그 어려운 걸 해낸다. 걷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들려주는 내용 중 한 단락만 발췌하자면 이렇다. “보행은 몸과 마음과 세상이 한 편이 된 상태다. 오랜 불화 끝에 대화를 시작한 세 사람처럼. 문득 화음을 들려주는 세 음표처럼. 걸을 때 우리는 육체와 세상에 시달리지 않으면서 육체와 세상 속에 머물 수 있다.”
저자가 보행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1980년대 반핵운동에 참여하면서부터였다. 미국 네바다 핵 실험장에서 그를 비롯한 반핵운동가들이 선택한 시위가 바로 걷기였다.
그런데 걷는다는 게 저항의 방법이 될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은 세상 누구보다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린 지난해 촛불 정국에서 어깨를 겯고 거리를 걸었으며, 이를 통해 세상을 바꾼 경험을 체득했으니까 말이다.
해외에서도 걷기는 민주주의의 끌차였다. 18세기 프랑스혁명이 대표적이다. 혁명을 완성한 건 괘씸한 권력자를 몰아내기 위해 베르사유로 향한 파리의 시민들, 특히 그곳 여성들의 행진이었다. “시장 여자들의 베르사유 행진은 평범한 시민들의 평범한 몸짓이 역사가 된 경우였다. …역사의 방앗간에서 그들은 빻아지는 곡식이 아니라 곡식을 빻는 방아였다.”
걷기의 의미를 개괄하던 이야기는 후반부에선 보행의 공간이 사라지는 현대 문명을 비판하는 쪽으로 뻗어나간다. 웬만한 거리는 자동차로 이동하고, 산책의 공간은 줄어드는 변화가 어떤 악영향을 끼칠지 설득력 있는 필치로 그려낸다. 저자는 “세상으로 걸어 나갈 필요가 없어지니, 공적 영역이 퇴보하고 사회적 조건이 악화될 때 맞서기보다는 물러서게 된다”고 강조한다. 보행의 공적 공간이 사라지는 건 민주주의의 퇴보를 예고하는 일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출간됐다가 절판됐던 책이다. 리베카 솔닛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만큼 이 책의 복간은 많은 독서가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듯하다. ‘걷기의 인문학’이 전할 감동이 어느 정도일지는 소설가 김연수의 추천사로 갈음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더 높이, 그리고 더 멀리 바라볼 때가 있다. 봉우리나 지평선과 같은 곳을. 바로 내가 걷고 있을 때다. 아무리 높고 멀리 있다 해도 걸어가는 한, 바라볼 수밖에 없다. 덕분에 걷는 일은 더 높이, 그리고 더 멀리 바라보는 일이기도 하다. …걷기의 역사를 말하는 리베카 솔닛의 목소리에서 희망의 역사를 듣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