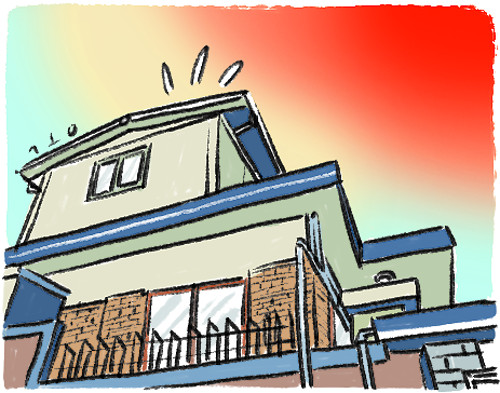
지난봄부터였던가. 매일 같은 시간, 내 방 창문 앞에 동네 노인들이 모여들어 담소를 즐기기 시작했다. 쉼터라도 되는지 의자도 대여섯 개 놓여 있었다. 나는 반지하집에 사람이 사는 것을 모르나 싶어서 부러 창문을 여닫아 봤지만 그들의 모임은 계속되었다. 짜증이 났지만 매몰차게 남의 방 앞에서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말하기가 힘들었고 결국 말할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다. 그리고 언젠가부터는 본의 아니게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요 며칠간은 날씨가 더워서인지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 대신 커다란 라디오 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남의 방 앞에서 라디오를 듣는 건가 싶어 나는 씩씩대며 밖으로 나갔다. 근처 다세대주택 옥탑방에 사는 할머니가 그곳에 홀로 나와 있었다. 할머니는 돗자리까지 깔고 누워 라디오를 들으며 옥수수를 먹고 있었다. 왜 혼자 나와 계시냐고 물었더니 할머니는 폭탑방에는 이 시간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고 했다. 폭탑방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재미있는 답변이 돌아왔다. “폭염 속 옥탑방. 찜통이야 찜통. 꼭 옥수수 찌는 찜통 같아. 땀으로 몸속의 짠물이 다 나오니까 내가 옥수수가 된 기분이야.” 웃을 상황이 아닌데 웃음이 나왔다. 집에 선풍기가 없냐고 물었더니 할머니는 있어 봤자 더운 바람이 불어 더 덥다고 했다.
집에 들어와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은 지난겨울 우리가 이사 왔을 즈음 그 할머니의 집에 간 적이 있다면서 그 집이라면 요즘 같은 날씨에 찜통 같을 거라고 했다. 할머니는 그날 누군가 버린 의자를 자기 집으로 옮기고 있었는데 때마침 마주친 남편에게 자신의 방까지 의자를 옮겨다 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남편은 의자를 들고 할머니와 함께 할머니가 사는 건물 꼭대기 층까지 올라갔다. 할머니의 좁은 방은 얼음장 같았다. 전기장판이 하나 있었지만 어떻게 잠을 잘까 싶게 추웠다. 옥탑방까지 걸어 올라가는 동안 생긴 몸의 열기가 고마울 정도였다. 겨울에는 얼음장 같은 방, 여름에는 찜통 같은 방에서 홀로 사는 할머니를 생각하니 우울했다. 남의 방 앞에서 라디오를 듣지 말라고 말할 기회는 영영 놓친 셈이었다.
김의경 소설가





